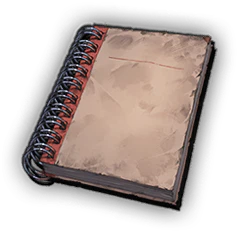
어느 의사의 수기
무너진 병원에서 발견된 의사의 일기장
XX년 9월 9일
김 간호사와 나는 무너져 내린 병원 한구석에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있다. 다른 의사와 간호사들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지 오래다.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걸 보면 이 무너진 병원이 외계인 눈엔 띄지 않는 모양이다. 약품과 소독제도 다 떨어져 간다.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. 아픈 환자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밖에 외계인들은 줄어들 생각을 안 한다. 얼른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났으면....
XX년 10월 11일
오늘 김 간호사가 적어 둔 거 같은 메모 한 장을 발견했다. 차라리 여기에 있는 것보다 방주로 가는 게 나을 거 같다고.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고 있는 것만 같다고 적혀있었다. 충분히 공감하는 바다. 하지만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. 몇 달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이곳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다시 평화를 되찾고 싶다. 분명 그럴 수 있을 거다.
XX년 10월 15일
김 간호사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는다. 예상했던 일이라 그런지 그렇게 놀랍지는 않다. 아마 방주로 간 거겠지. 오늘도 환자들은 지상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우리 병원을 찾는다. 환자가 오지 않는 그날까지 난 이 자리를 지킬 거다.
XX년 12월 8일
오늘 마지막 환자가 사망했다. 더 이상 병원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. 환자가 없으니 할 게 없다.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잡생각이 끊이질 않는다. 이 와중에 배가 고프다. 제대로 된 음식을 언제 먹었지…? 이제 나에게 남은 거라곤 오로지 수술용 칼과 사망한 환자뿐이다. 자꾸 나쁜 생각이 든다. 나는 환자를 지켜야 하는 의사다. 점점 내가 이상해져 가는 거 같다. 누구라도 좋으니 병원을 찾아 줬으면 좋겠다. 내가 정신을 찾을 수 있도록.